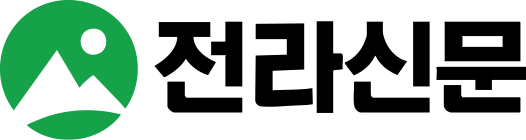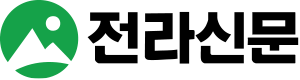(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립대병원이 공정의 정신을 배신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북대병원에서 지난 5년간 무려 148명의 임직원 친인척이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중 84퍼센트가 정규직이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노골적인 특혜의 구조다. 공공을 사유화한 집단적 일탈이자, 대한민국 청년세대가 그토록 외쳐온 “공정한 기회”에 대한 정면 도발이다.전북대병원은 이름만 공공병원일 뿐, 실상은 폐쇄적 내부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혈연 공동체’ 수준이다.
병원 수뇌부는 공정 채용을 외치지만, 그 구호는 자기 식구를 위한 알리바이로 전락했다. 공식 통계가 보여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원 안팎에 뿌리내린 도덕적 타락과 조직적 둔감성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이 내부 기강 하나 세우지 못한다면, 그곳의 진료와 연구 또한 신뢰받기 어렵다.이 사태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피 말리는 경쟁 속에 공정한 기회를 찾던 그 시간에, 누군가는 이름 하나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누가 누구의 친척인지가 채용의 기준이 되는 병원, 이것이 과연 국민의 병원인가. 전북대병원은 더 이상 지역의 자랑이 아니라, 공정의 가치를 조롱한 부끄러운 상징으로 남았다.정부와 교육부의 방관에도 책임이 무겁다.
국립대병원을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치외법권으로 방치한 결과가 지금의 적폐다. 감독기관으로서 이 정도의 부패를 몰랐거나, 알고도 눈감았다면 이는 공범이다.
이제 ‘자율성’이 아닌 ‘투명성’과 ‘책임’으로 제도를 다시 세워야 한다. 전국 국립대병원 전수조사와 채용 전면 감사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부당 채용이 확인된다면 책임자 전원은 법적·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공정은 국가의 근간이다. 청년들이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냉소에 빠질 때, 사회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다.
전북대병원 사태는 공공기관의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 잔해가 청년세대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를 보여준다.전북대병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병원’으로 다시 서려면, 뼈를 깎는 자정에 나서야 한다.
고질적 연고주의와 특혜 구조를 도려내지 못한다면, 국민은 그 병원을 더 이상 공공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청년의 기회를 빼앗은 조직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