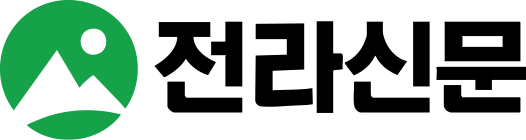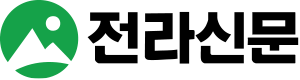(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국립대학교병원이 ‘국민의 병원’이 아니라 ‘가족의 병원’으로 전락했다. 공공의료를 책임진다는 전북대병원이 지난 5년간 임직원 친인척 148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다. 숫자 자체가 충격이 아니라, 그 안에 드러난 도덕적 해이와 제도적 부패가 참담할 따름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대놓고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전북대병원은 스스로 ‘공정한 채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폐쇄적이고 안하무인격인 ‘혈연 공화국’에 다름 아니다. 148명 중 84퍼센트가 정규직 채용이다. 도대체 어느 민간기업이 이 정도의 가족 채용률을 용납하겠는가. 공공기관이 공정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내 사람 챙기기’의 요람으로 전락했다.
국민은 병원을 신뢰하기보다, ‘누구 집 사람인지’부터 묻게 되는 비극적 현실에 직면했다.이 병폐의 근원은 제도적 무책임과 감독의 포기다. 국립대병원은 명목상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시가 느슨한 특수법인이다. 내부 규정을 빌미로 채용 과정이 자기들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공정한 경쟁은 사라지고, 채용은 권력의 사유물이 되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름을 내건 ‘집단적 배신’이라 부를 만하다.전북대병원은 더 이상 지역의 자랑이 될 자격이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을 사적 연결망이 점령한 상황은 명백한 기강 해이다. 병원 수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내부 인사 시스템 전면 감사와 채용 적정성 조사는 당장 착수해야 한다. ‘누가 누구 친척인지’부터 명확히 밝혀내고, 부당 채용 사례가 확인된다면 관계자 전원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교육부 역시 공범이다.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립대병원을 사실상 방치해 온 결과가 지금의 참상이다. 더 이상 ‘기관 자율성’이란 명분 뒤에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제도적 정화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사익을 쌓는 병원, 그것은 더 이상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다.
전북대병원이 진정 국민의 병원으로 거듭나려면, 썩은 관행을 도려내는 아픔부터 감수해야 한다. 특혜와 연고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전북대병원은 앞으로도 ‘공공의 얼굴을 한 사병조직’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