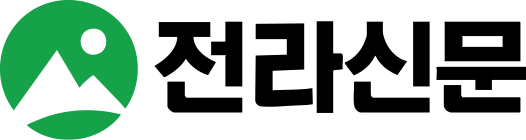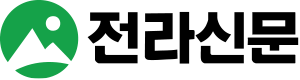(전북경제) 조계철 기자 =전주 ‘530% 고밀 개발’…시행사 이익만 키우는 난개발의 길전주시가 추진 중인 ‘용적률 530% 고밀 개발 사업’이 지역 사회에 우려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도심 활성화와 주거 공급 확대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행사 수익만 극대화하는 무리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평당 토지비를 낮춰 분양 매출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조는 시행사에만 이익을 주는 설계다. 문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명백하다는 점이다. 용적률이 500%를 넘는 초고밀 개발은 주거 환경 악화, 교통 혼잡, 인프라 과부하, 그리고 민원 폭증이라는 문제를 불러온다. 일조권·조망권·통풍 등 기본적인 주거 쾌적성이 무너지고, 난개발에 대한 시민 반발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이미 서울과 경기 지역의 여러 사례에서 주민 갈등과 공사 중단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경제성도 문제다. 공사비가 평당 800만~850만 원에 달하고, 전주 일반 택지의 토지비가 평당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분양가가 평당 2,500만 원을 넘어선다면 지역 현실과 괴리된 ‘고분양가 폭탄’이 될 것이 뻔하다. 실제로 시행사 자광이 제시한 분양가는 시장 수용 한계선(2,200만~2,300만 원)을 훨씬 초과해 특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투기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더욱 심각한 것은 공공기여 산정과 집행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이다. 의정부, 성남 대장동, 평택 현덕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된 특혜·투기 사건들은 ‘지자체 주도의 개발사업’이 얼마나 쉽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주 역시 그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개발은 결국 지역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실패로 귀결될 뿐이다.전주의 고밀 개발은 단기적 수익 논리에 매몰된 채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의 삶을 외면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시행사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사업 추진 논리를 즉각 멈추고, 투명한 공공검증 절차와 주민 중심의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층 건물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다.